이원화 캠퍼스에 관해 (+반수 vs 캠퍼스 간 전과)
이원화 캠퍼스, 어찌 보면 재수(반수), 편입과 함께 전과라는 또 다른 입시 기회를 제공한다. 이원화 캠퍼스란 무엇인가? 본교-분교 개념이 아닌, 같은 학교가 지리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캠퍼스들을 뜻한다. 일단 명목상으론 그렇다.
서울대...는 넘어가고. (관악이랑 연건 둘 다 서울에 있어서 딱히 의미가 없다. 거기에 연건캠은 메디컬 모임이다.) 연세대는 송도캠퍼스가 이원화다. (여긴 과별로 나뉜다기보다 한 학년을 통째로 송도에서 보낸다) 그런데 원주캠퍼스는 분교(미래캠퍼스)다. 고려대도 세종캠퍼스는 분교다. 성균관대는 가장 성공한 이원화 캠퍼스 학교다. 인문사회캠(서울)과 자연과학캠(수원)으로 나뉘어 있다. 한양대는 그 유명한 ERICA 캠퍼스가 분교로 운영되고 있고. 중앙대는 서울캠(흑석), 평동캠(없는 취급..), 그리고 다빈치캠(안성)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. 평동캠퍼스는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 하진 않는다. 경희대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(용인/수원)로 이원화 되어 있고, 한국외대도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(용인)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.
난 고3때 이원화 캠퍼스가 어떤 건지 잘 몰랐다. 그냥 다 분교인줄 알았다. 사실 수험생들에게 이원화 캠퍼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. 일단 이원화 캠퍼스의 유형을 자세히 보자면...
- 연세대: 신입생들을 송도캠퍼스에서 1년동안 유배시킴, 이후 대부분 서울캠에서 생활
- 성균관대: 인문사회 학과는 서울캠, 자연과학 학과는 수원캠
- 중앙대: 대부분 서울캠, 농/체/예대는 안성캠
- 경희대: 대부분 서울캠, 외국어/공학 등은 용인캠
- 한국외대: 대부분 서울캠, 이공학은 용인캠
이렇다 할 공식은 없지만 각 학교별로 포지션이 겹치지 않게 편성한 것을 볼 수 있다. 문제는, 이원화 캠퍼스 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. 이런 경우 서울 밖에 위치한 제2캠퍼스가 서울캠퍼스에 비해 입결이 낮은 편이 많다. 그 말은 즉, 제2캠퍼스의 입결이 낮은 과로 진학하여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이 가능하다. 사실 이건 엄청난 장점이다. 반수나 재수를 하면 1년이 날아가게 되는데 (특히 반수생의 경우 1-1학기 성적을 잘 받았더라도 그냥 증발한다) 전과를 하면 손해보는 게 없다. 칼졸업도 가능하다. (물론 학교마다 다르다. 이수과목에 조건이 걸린 경우 계절학기를 얹어야 간신히 졸업이 가능할 수도... 무엇보다 캠퍼스 간 전과 제도가 없다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.)
더군다나 최근에 수도권 대학 관련 법이 바뀌어서 일부 대학에서 캠퍼스간 전과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. 중앙대는 어떻게 변했냐고? 캠퍼스 간 전과에 필요한 사항들을 일부 폐지했다. 전출 인원도 좀 늘었고. 재학생 내부에선 학교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...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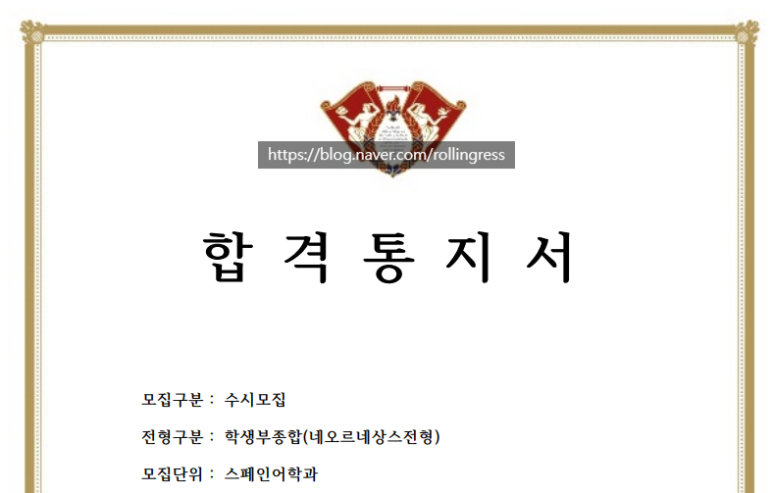
위 사진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스페인어학과 합격증이다. 외국어대학. 즉, 국제캠퍼스(용인)에 있다. 합격증 어딜 봐도 국제캠퍼스란 말은 없다. 적어도 학교 내부에서는 하나의 경희대로 취급하니까. 경희대도 이원화가 잘 된 편에 속하긴 한다.
일단 다른 학교는 내가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. 다만 중앙대의 경우 생명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면, 다빈치캠퍼스의 생명공학대학 학과에 진학하여 서울캠퍼스 생명과학과로 전과하는 방법이 있다. 생공대의 입결이 대략 국숭세단광명상가 정도에 포진하는데, 정시 점수가 저 정도가 나온다면 중앙대 다빈치캠으로 지원하여 추후 전과를 하면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도 서울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.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, 캠간 전과에는 전출 TO가 정해져 있다. 즉 누군가에게는 차라리 반수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뜻. 그렇지만, 전과의 매력은 시간적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. 그리고 편입처럼 전적대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는다. 자세한 내용은 입시 관련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.